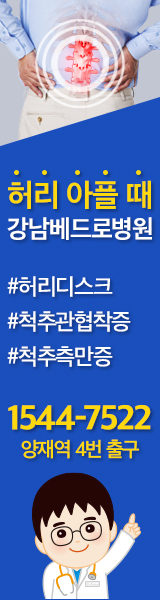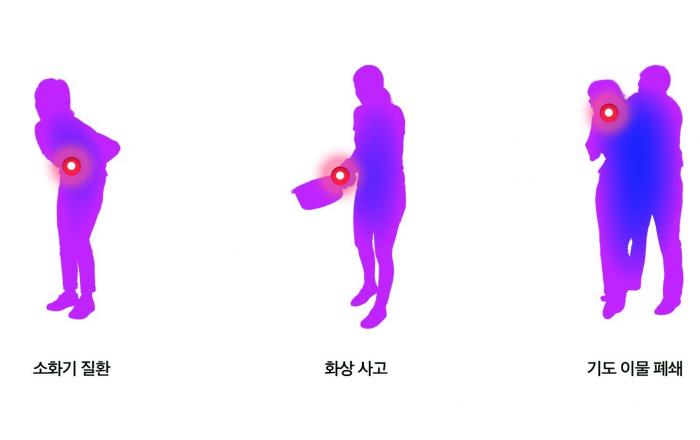잠을 설친 다음 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까지 처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이 반복되어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일상’이 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원인과 생활 습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의학적 신호다.
수면은 우리 몸의 단순한 휴식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면의 단계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른데, 초기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은 뇌와 몸의 회복, 면역력 강화, 노폐물 제거 등 생리적 재생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반면 얕은 수면인 렘수면(REM)은 감정 조절과 기억 및 학습의 공고화에 관여한다. 이 수면 단계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뇌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불면증은 보통 소인적 취약성, 촉발 요인, 지속 요인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발생한다. 통계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혹은 가족력이 있거나 불안·우울과 같은 심리적 취약성이 있을 때 더 잘 나타난다. 여기에 심한 스트레스나 급성 질환, 신체적 통증 같은 사건이 계기가 되어 불면이 시작되기도 한다. 특히 잠이 오지 않는데도 침대에 오래 누워 있거나, 침실에서 TV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오늘 밤에는 꼭 자야 한다’는 강박적인 걱정을 하는 습관은 불면증을 만성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주변 환경 또한 수면의 질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수면 중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심박수가 증가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고, 너무 낮으면 체온 유지를 위해 몸이 긴장하며 각성 상태에 빠지기 쉽다. 습도 역시 너무 높으면 땀 증발이 방해되고,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숙면을 방해한다. 계절에 따른 일조량 변화 또한 수면 시간과 구성을 변화시키는 주요 외부 요인 중 하나다.
신경과적 측면에서 보면 불면증은 중추신경계의 수면-각성 조절 기전에 이상이 생긴 상태다. 정상적인 뇌는 잠들어야 할 때 각성 신호를 차단하고 수면 모드로 전환되지만, 불면증 환자의 뇌는 각성 신호가 과도하게 유지되어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불균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만성 불면증의 치료에는 약물에 앞서 인지행동치료가 우선적으로 권고된다. 여기에는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어 침실을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뇌에 각인시키는 자극조절요법, 실제 잠드는 시간에 맞춰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조정해 수면 효율을 높이는 수면제한요법, 그리고 복식호흡 등으로 신체적 긴장을 완화하는 이완훈련 등이 포함된다.
많은 이들이 수면제 사용과 치매 위험의 연관성을 우려하여 약물 치료를 주저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수면제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 용량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장기간 고용량을 복용하거나 여러 종류를 동시에 복용할 경우 인지 기능 저하나 낙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세심한 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뇌의 수면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며, 기저질환으로 인한 통증이나 야간뇨 등이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 동반된 신체 질환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숙면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뇌의 생체시계를 안정시키고, 낮 동안 가벼운 운동과 햇볕 쬐기를 통해 수면 리듬을 바로잡아야 한다. 낮잠은 15분 이내로 짧게 제한하고, 카페인이나 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의 강한 빛 자극은 피해야 한다. 수면 장애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혈관 및 대사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과 직결되는 만큼,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