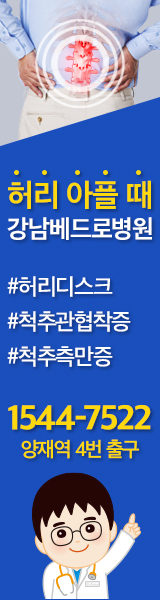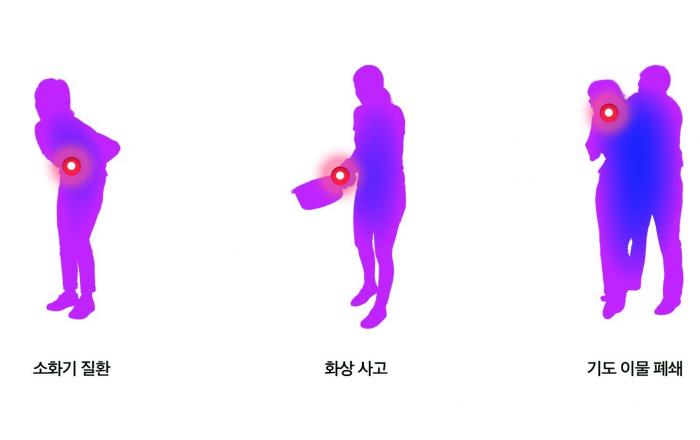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하유신 교수

전립선은 남성만 가지고 있는 장기로, 위치는 방광 아래 골반 깊숙히 위치해 있다. 전립선의 첫 번째 기능은 소변이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중 전립선 요도의 일부를 구성해서 소변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게 된다. 두 번째 기능은 정자의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액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전립선암이 진단된 환자를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면 거의 공통적으로 아무 증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전립선암을 진단받고도 믿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 증상과 거의 비슷해,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이 되는 환자도 많다.
그 중 배뇨 증상이 주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거나 본 후에도 남아 있듯한 잔뇨감, 처음에 소변보는게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변증상과 관련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립선암의 초기 진단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차 의료 기관이나 개인병원에서 PSA 혈액 검사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예전에는 바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였지만, 조직 검사는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불편감과 통증을 동반했었다. 또한 PSA 수치가 높다 하여 모두 전립선암은 아니므로 실제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MRI 검사가 조직 검사 여부를 결정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MRI 영상은 암이 의심되는 부위를 먼저 확인한 후, 의심되는 부위를 타겟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MRI 검사를 통해서 최대 90%까지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조직 검사의 정확도를 최대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전립선암은 수술을 포함한 근치적 치료법과 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전이되지 않고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을 중심으로 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반면 전립선에서 벗어나서 암 조직이 타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치료 방법의 선택은 전립선암의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다.
필자가 진행했던 대규모 분석 연구로, 전이가 없는 전립선암 환자들에게서 수술 치료와 약물 치료에 생존율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수술적 치료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사망위험을 명확하게 감소시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립선암의 수술적 치료는 전립선과 정낭을 한 번에 완전히 적출하는 과정이다. 전립선 암 조직을 잘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립선암 후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겨야 될 구조물 보존해야 될 구조물을 잘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립선암 수술 중 가장 힘든 합병증이 요실금이다. 관약 조직이 요도를 꽉 잡아줘야 하는데, 이 조직이 전립선과 붙어있으므로 전립선 제거 시 최대한 보존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요실금이란 합병증을 최소화한 섬세한 수술을 위해 로봇 수술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립선암 전이가 있는 환자는 약물 치료를 한다.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이 암 조직을 자극하여 성장시키고 진행시키는 암이다. 그래서 전립선암 약물 치료의 주 작용 메커니즘은 남성 호르몬을 차단 하여 암조직의 성장과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립선암 약물 치료에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남성 호르몬 차단을 중심으로 하며 각 약물은 작용 기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암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전립선암 성장과 진행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치료를 한다.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와 루테시움 같은 방사선 동의 원소 치료가 새로운 치료의 가능성을 열고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신 치료법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